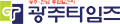특히 무공천 재검토의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리며 약속파기, 거짓정치의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결정으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6·4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하나된 새정치연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 50% + 당원투표 50%’ 방식으로 무공천 철회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책임있는 지도자의 고뇌의 소산이자 약속 저버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알리는 경종”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제 소신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안 공동대표의 결단이 왜곡돼서는 안된다. 안 공동대표의 선택은 과거로의 철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 공동대표의 선택은 일신의 안위를 굳게 하는 구차한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당당한 선언”이라며 “특별히 당원에게 호소한다. 오늘 국민과 당원의 뜻을 확인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린 하나가 돼야 한다. 당장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하고 4월 국회에서 민생 챙기는 일에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는 “만에 하나라도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 저와 다르더라도 저는 그 뜻을 따르겠다”며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제 소신을 접고 후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당원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확인을 받아 더 굳세게 나가자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논쟁과 토론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독이 될 것”이라며 “결정이 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신속하게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로잡고 오직 지방선거 승리만을 위해 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과의 소통, 국민과 당원의 존중을 평가받을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니다. 정당공천과 관련해 모든 혼란의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혼란과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여론을 다시 수렴키로 한 것과 관련,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 고집에서 철수했다”며 “늦었지만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당의 혼란을 축소하기 위해 회군을 결정하면서 대통령과 여당 탓만 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스럽다”며 “안 대표는 정치 역경 속에서 네 번이나 회군했다.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던 기초선거 무공천이 과연 진정한 새정치인지 현실에 발을 붙이고 깊이 성찰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안 대표가 개인의 정치생명을 위해 정통 야당을 사지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며 “공당의 대표라면 좋은 약속과 나쁜 약속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쁜 약속이라면 솔직히 고려하고 바꿀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아집보다는 대의를 따르는 게 진정한 지도자임을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기초공천제 폐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한 소모적인 경쟁이 끝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제는 진짜 새정치의 근간인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국회에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 3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 이루 헤아리기 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법안들 처리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게 새정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