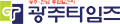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표방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재선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동남아 3국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동의 화약고 '가자 지구'가 발목을 잡았다. 아시아 순방 직전 터진 가자 교전은 엿새째 지속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사망자 109명을 포함해 800여 명을 넘어섰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끝내며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눈치다. 그러나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갈등이 재촉발되면서 오바마의 중동 정책 근간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 오바마, 亞 순방길에도 온통 '가자' 걱정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한 오바마는 20일 캄보디아에 도착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가자지구 상황보고는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와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역시 미얀마에서 캄보디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태국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가자지구 관련 질문을 받았고 정황을 모두 파악한 자세한 대답을 내놨다.
미국은 가자 지구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백악관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로 인해 가자지구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방콕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에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도록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 전면전에 나서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서 군사 작전의 확대 없이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 이집트 연설 약발 다했네
문제는 오바마의 입심이 중동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가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최대 충돌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8년 말이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으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인은 1400명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 당시 중동의 평화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해 6월 이집트 카이로대학 그랜드홀에서 13억 무슬림을 위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초안을 작성한 연설까지 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9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협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지난 1967년 중동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한 영토문제로 결국 3개월만에 결렬됐다.
◇ 결국 이집트 중재만 기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사이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른바 '아랍의 봄'이 시작됐다. 중동 각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로 친미성향의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반미성향의 이슬람 정부가 들어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위축됐다.
특히 최대 동맹이었던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정권이 축출된 후 반미성향의 무슬림형제단이 지지하는 모하메드 무르시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미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가자의 지배세력인 팔레스타인 하마스 역시 무슬림 형제단에 뿌리를 두고 있어 미국은 이번 가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집트에 의존하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만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중재를 요청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하임 말카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집트 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정전을 중재할 최적임국이라는 판단 아래 이집트가 이번 위기 중단을 위한 중재에 주효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