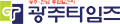19일 여수시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여순사건 66년을 기념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시작으로 여순사건 조례제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사진과 유물을 전시하는 '지리산과 여순사건' 사진전, 유적지 기행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여순사건은 지난 2005년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결성돼 2010년까지 활동하면서 조사한바 있으나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냈으나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해 지난 1948년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28일 수복 이전까지 약2년여 동안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인과 경찰등 수천 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의 사과를 권고 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나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순사건 발생 이후 여수와 순천, 전북 및 경남 일부 민간인들은 집단 희생의 억울함 속에서도 '빨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으며, 자손과 친·인척은 수십 년간 숨죽이며 말 못할 고통과 함께 명예회복의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서 진상 규명 노력이 시작되긴 했으나 현재까지 더디게 진행 중이어서 답답함만 더해주고 있다.
최근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노력은 민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의 연장선에서 시작됐다"면서 "그러나 이미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사과, 국가 기념일 제정 등 정부의 진상규명노력 및 명예회복이 이뤄진 제주4·3사건에 비해 진실규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 했다.
이낙연 전 국회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공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또 6·4지방선거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들도 후보토론회때 일제히 '여순사건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위령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여수시민 이모(49)씨는 "'반란사건'으로 명명되면서 수십 년간 지역과 지역민에게 심각한 오욕을 안겼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언제쯤 규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채찍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1948년 10월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 발단이 돼 여순사건이 시작됐다. 해방정국의 혼란상황속에 제주 4·3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이승만 정부는 4·3사건의 무력진압을 여수 주둔군에게 명령했으며 군인들은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파병을 거부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정부군의 대대적 진압과정에서 여수와 순천 등 지역민들이 집단 희생됐다.
여순사건과 같이 6·25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2011년 18대 국회에서 연속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도 제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