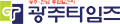그러므로 참고 인내하고 살면, 부부란 두 개의 절반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가 되어간다. 때문에 옛날 어머니들은 바가지에 금이 가 쓰지 못하게 되면 버리질 않고 주렁주렁 엮어서 고이 보관해두곤 했다.
아버지가 무슨 일로 화가 치밀어 폭발할 기미가 모이면 살짝 빠져나가 금이 간 바가지를 부엌에 늘어놓는다.
세간을 깨러 부엌에 들이닥친 아버지는 이 바가지를 짓밟음으로써 그 강한 파열음으로 울화를 푼다.
금이 간 요강이나 뚝배기도 버리질 않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보관, 긴요하게 썼던 것이다. 이무리 화가 났다 해도 세간을 무차별로 파괴한다는 법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옛 어머니들은 잘 터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바가지 긁는 것으로 마누라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이 같은 심리의 연장선에서 합리화 시킬 수가 있다.
소리만 요란스럽고 경제적 손실을 극소화시킴으로써 화를 푸는 현명한 전통적 스트레스 해법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화를 속으로 풀 줄 알았던 것이다.
지식층에서도 박을 갖고 화를 푸는데, 서민들처럼 물리적으로 풀지 않고 철학적으로 푼다. 몹시 울화에 시달리는 날이면 박 한 덩이 안고 집을 나간다.
그리고 강물가에 가서 그 박을 띄워 보낸다. 울화나 분통을 박에 유감시켜 망망대해 속에 소멸시켜버리는 형이상학적인 해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한국에 있어 박은 긁어 대건, 짓밟아 깨건, 강물에 띄워 보내건 울화를 속으로 푸는 스트레스 문화재였다.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지붕이 가라앉을 것만 같이 데굴데굴 많은 박을 기른 이유를 새삼스레 알 것만 같다.
한데 요즘에는 박도 기르지 않고 아무리 긁어대고 밟아대도 소리가 나질 않는 비닐바가지로 탈바꿈한 탓인지, 속으로 화를 풀지 못하고 걸핏만 하면 분화구처럼 겉으로 화를 내 뿜는다.
옛날 같으면 바가지 긁는 것으로 해소시켰던 고부 불화나 부부 불화가 가출이나 별거, 이혼, 죽음 같은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파멸률이 지난 10년마다 30%씩 늘어왔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선시대 부부들은 여러 가지 불화를 겪었지만 참고 문제를 풀면서 살았다.
이덕무(1741~1793)는 ‘사소절’에서 “남편은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고 믿어 아내를 억누르려고 하고, 아내는 ‘너나 나나 동등한데 무슨 굽힐 일이 있겠느냐’ 하는 데서 부부간 불화가 생긴다”고 했다.
가난이나 남편이 첩을 들이거나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 남편이나 아내가 처가나 시댁에 잘하지 못하는 것도 불화의 주된 이유였다.
유희춘(1513~1577)의 아내 송덕봉(1521~1578)은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시어머니 상을 지극 정성으로 치르는 등 시댁에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당신은 친정아버지 제사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고 무덤에 비석도 세워주지 않느냐”며 나무랐다. 갈등의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듯 ‘스스로에게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화해의 방법 역시 오늘날 부부에게도 조언할 만하다.
조선시대 대표 유학자 퇴계 이황(1501~1570)은 제자에게 “성품이 악해 스스로 소박을 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면 (부부간 모든 갈등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유희춘 역시 아내의 편지를 받고는 장인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줬고 이후 부부의 금실은 깊어졌다.
남성 중심적 시대이기에 옛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모양처의 덕목 중에는 남편의 잘못된 행실을 따끔하게 충고해 바른 길로 이끄는 적극적인 내조가 많았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소통하고 사랑하면 행복이 따로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