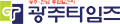일자리 유망 이공계 육성 예산 2362억원 편성
인문계 고작 344억…대학 교육 황폐화 불가피
고교무상교육 무산, 현 정부 임기내 시행 불투명
교육부는 10일 55조7299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3조3538억원에서 4.45% 늘어난 규모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716억원을 포함해 41조4423억원, 고등교육은 9조2322억원, 평생·직업교육은 589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교사·학생 교류 확대, 다자녀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인구론'·'문송'…현실 외면한 교육부
최근 채용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는 인구론(인문계 학생의 90%가 논다),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이다. 그만큼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취업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산업수요에 맞춰 이공계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사업)'에 2362억원을 편성했다.
프라임사업의 골자는 교육부가 제안하는 미래유망 분야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면 최대 3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참고하고 있는 유망분야는 바이오의약, 신소재나노, 첨단도시, 로봇기술 등 이공계에 몰려있다.
교육부는 이공계 강화로 위축될 수 있는 인문학을 지원하기 위해 '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을 신설했지만 예산은 고작 344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학사구조 개편의 반대급부로 제시했던 인문학 강화사업의 내년 예산은 4분의 1 수준이다. 인문학계는 대학의 황폐화, 인문학 고사를 걱정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했던 '2000억원 이상'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344억원만 신규 사업으로 되고, 나머지는 인문학 인프라와 연구에 일부 증액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고교 무상교육' 또 물건너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고교 무상교육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4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서벽지에 우선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 2016년에 완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16년을 포함해 3년째 국고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461억원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임기내 실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관복 기조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 국가 및 지방교육재정 등 전반적인 국가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무상교육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미반영…거센 반발 예상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교육교부금에서 100%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시·도교육청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상태가 된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2016년 정부 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방통행식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추진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