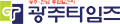호남권 비례 25% 우선추천 제도 유명무실
지역구 후보·시도당 당직자들도 허탈감 커

[광주타임즈]뉴시스·양선옥 기자=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들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호남 홀대론’이 다시 논란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각 16년, 8년 만에 지역구 후보를 모두 출마시키며 의욕을 보였으나 비례대표 순번 결과를 놓고 동요하는 등 총선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 전남도당 위원장, 김가람 전 최고위원, 양혜령 전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 채명희 전 광주시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 김인숙 전 국민의힘 광주 북구을 당협위원장 등 지역 출신 정치인 6명이 등록했다.
비례대표 공천 순번 발표 결과 당선 안정권인 20번 이내에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 출신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8번)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수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당세를 키워 온 정치인들이 모두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선 안정권에 배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주기환·김화진 전 위원장과 김가람 전 최고위원이 배제된 것을 두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남지역 대표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 인사로 꼽히는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에서 24번을 받자 후보직을 반납했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주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인사 25% 우선 추천하는 내용을 당규에 담고 있지만 이번 공천에서 광주는 완전히 배제됐다. 당원들과의 약속을 당에서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 전 위원장의 반발은 결국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광주, 전북, 전남) 출신 인사를 당선 안정권인 20위 이내에 25% 규모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김가람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최고 당세를 이끈 전남도당위원장·광주시당위원장을 (뒷순위)22번과 24번으로 배치하고, 이를 ‘충분한 배려’라고 말하는 공관위의 모습은 호남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전남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도 동요하는 모습이다.
광주 지역구 한 후보는 “호남에 대한 배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선관위 공식 후보 등록 전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이끌어 왔던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당직자들도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중앙당의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16년 만에 총선 지역구 후보 모두 출마시키며 의욕을 보여왔는데, 이번 결정을 보며 상실감이 크다”며 “자칫 후보들까지 동요하며 총선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22번에 배정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당의 방침이니 따르고 신중하게 기다리는 게 정당인으로서 도리다. 전과 등 하자가 있으면 커팅되고 그러다 보면 상위 순위로 오를 수도 있다”며 “비례 순번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 차분히 진중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