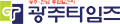집 주인이 하인들 시켜 닭을 잡고 진수성찬을 차려 저녁상을 거하게 내어왔으므로 굶주린 세 놈들은 한마디로 오랜만에 포식을 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두 사람이야 초조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땡전 한 닢 없는 놈들이 숙식비를 넉넉히 준다는 허풍으로 주인을 속여 잘 얻어먹기는 했는데 뒤 감당이 켕겨서 내일 당장 볼기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눈앞이 캄캄했지만 어차피 돈 떨어져 거지 신세인데 우선은 배를 채우고 나니 험한 길 걷느라 지친 몸은 자꾸만 눕고 싶어지는데 속 모르는 주인장은 말벗 해드리겠다며 사랑채에 나와 벼슬 욕심을 내비치면서 안동김씨 가문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관계의 끈을 묶을 욕심만 토해내고 있었다. 눈치 빠른 이 건달 녀석은 주인과 시간을 오래 섞을수록 자신들의 허세가 들통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피곤하니 일직 쉬겠다면서 기왕에 만났으니 한 며칠간 더 묵어가면서 시도 한수씩 지어보고 담소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여유를 부리며, 주인장께서도 별로 바쁘시지 않으면 함께 한양에 가서 높은 관직에 있는 종가의 어른들께 신세진 고마움을 인사소개 시키겠다고 말하자...주인장은 침까지 꼴깍 삼키면서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살피던 건달 놈은 한양에 가서 머무르는 노자는 신경 쓰지 말고 시간만 내면 된다고 부추기니...이 양반은 눈자위가 상하로 실룩거리면서 이게 무슨 호박이 넝쿨 채로 굴러온 횡재인가 싶었는지 감흡(感洽)해 하다가 서둘러 자리를 비켜주면서 내일은 인근 선비들 모셔다가 크게 점심 잔치를 열어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며 아무 걱정 말고 노독(路毒)이 풀릴 때까지 푹~쉬었다 가시라는 말을 끝으로 방을 나갔다.
그러자… 안도에 한숨을 내쉰 샌님 같은 두 선비는 긴장이 풀렸던지 옆으로 쓰려져 금 새 코를 골았지만, 이 건달 녀석만은 벌려 놓은 사기극이 중차대한지라, 한가하게 잠이 올 까닭이 없었다. 생각할 궁리가 많은 이 녀석은 슬그머니 문밖을 나서니 속 모르는 달님은 남의 속 창자라도 들여다 볼 것처럼 환하게 웃는 보름달이 되어 세상을 차디차게 깔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달구경조차도 관심 밖이고 이 난관을 뚫고 나아가 과거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여기서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과거 급제는 고사하고 양반가문 능멸 죄를 뒤집어쓰고 몰매 맞다가 살아남는다 해도 장독(杖毒)에 사지 지탱도 못하고 다리 저는 거지꼴로라도 고향에 돌아갈 수는 있을지도 막막했다.
이런 저런 생각에 마당을 서성이다가 담장 따라 집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수 천석지기 부자라는 소문답게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으며 담장 뒤로는 야산에 접해 있어 다소 높은 둔 턱으로 기웃거리며 오르다가 보니 뒤란의 안채로 보이는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이 녀석은 담장을 기어올라 사뿐히 내려서서 창문으로 다가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종이를 후벼보니 성장한 처녀가 시집갈 준비인지? 수틀을 쥐고 바느질에 몰두하는데 그 처녀가 어찌나 아름다운지...하늘에 산다는 선녀가 저보다 더 어여쁘랴 생각이 들 정도였다. 순간! 이 녀석의 눈은 빛났다. 방으로 들어가 저걸 덮친다면 어떨까? 떠 올리노라니...수년전에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윗동네 살던 늙은 과부 평달 어미를 따먹었던 기억이 스쳤다. 평달 어미는 50대 과부로 서방 죽고 20년을 혼자 사는 여자로 소문났는데 마을에 힘깨나 쓴다는 젊은것들을 골라 몸 잘 대주기로도 꼽히는 여자란 사실을 당시엔 잘 몰랐었다. 그 여자에 관해서 별로 아는게 없었던 이 녀석은 나물 뜯으러 산에 온 평달 어미가 덥다며 냇물에 세수하다가 발이 삐었다고 주물러 달라는 엄살에 평달 어미 발목을 만지작거리다가 손이 가랑이 까지 올라가 속옷을 벗겼던 것이다.
이 녀석은 글공부해서 과거보겠다는 핑계로 농사일을 게을리 해온 터라, 많지는 않아도 논 밭 관리를 마누라가 도맡아 하여 근근하게 사는 형편이었고 부지런한 마누라는 그야말로 눈 코 뜰 사이도 없이 일에 묻혀 살다보니 밤만 되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를 정도로 고단하게 잠들지만, 이 녀석은 꼴에 남자라고 여자 생각날 때마다 코고는 마누라 속 고쟁이 들어 올리고 오징어 썩는 냄새 나는 거시기를 찾아 힘쓰노라면 마누라는 잠을 깨기는 했는지...잠시 푸드득 거리듯 거친 숨 몰아쉬고 무엇인가를 싸는둥마는둥 일이 끝나기 무섭게 되돌아 누우며 골던 코를 계속 이어가 마치 힘차게 돌아가는 발동기 소리 내듯 시끄럽게 하는 그런 마누라와는 비교가 안 될 만치 생판 다르게 평달 어미는 지랄발광을 해대며 받아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