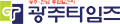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오늘은 참으로 비 오는 가을의 깊은 상처 입은 상념이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천로 역정에서 존 번연은 ‘죽음은 감옥에서 나와 궁궐로 들어가는 통로일 뿐, 폭풍의 바다에서 헤어 나와 안식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니, 죽음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門)이라 했다. 불교나 기독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하고 부활을 이야기한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삶과 죽음은 연속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이승의 선한 생각과 행동이 저승과도 연결되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다.
죽음은 바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웰빙(well-being)이 곧 웰다잉(well-dying)’의 논리가 아니겠는가?. 모든 만물은 에너지를 생성한다. 내가 착한일을 하면 그 선행의 에너지는 바로 뒤돌아서 내게로 돌아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 비록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에너지지만 결과는 다시 돌아와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학문에 열중하면 그 에너지가 성공이라는 에너지로 변하여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선사한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에너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윤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별은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것이다. 죽음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귀결해본다.
우리의 삶은 끝이 없고 다시번복을 거듭하며 생을 유지한다. 선한 자는 선함을 유지하며 생을 살아가고 또 다시 윤회라는 이름으로 선함의 덕을 입는다. 그러나 악함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또 다른 악을 생산하기에 우리는 선함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 우리는 결과라는 가을다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 땀 흘려 이룬 그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야한다.
일년 사계절은 나름대로의 활동이 주어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하는 절기 따라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지만 그 활동의 근본은 모두가 똑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우주의 모든 순환이 자연의 법칙과 함께 윤회와 연기로 이루어져있다. 모든 만물이 생과 멸을 거듭하며 태어나 생로병사(生老病死)로 또한 사생병로 (死生病老)로 이루진다. 이는 태어나서 죽는 생사관이 아닌 죽어 다시 태어나는 사생관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죽어야한다. 잘 죽기위해서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함을 잊어서는 않된다.
선함이 없는 멸(滅)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또한 죽어서 다시 태어난 사생의 관념에서 보더라도 잘 죽어야 한다. 이는 잘살아야한다는 뜻 이기도 하다. 어떤 사상가는 이처럼 말하기도하다. ‘삶의 완성을 죽음’으로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나는 죽음에 대한 매혹을 느낀다.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를 스스로 예우하며 죽고 싶다. 그동안 땀 흘리고 씻고, 음악 듣고, 아무 것도 없는 식당에서 이렇게 떠드는 즐거움을 만끽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허무’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의 열정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엄습할 것이다.
티베트의 배리커진 스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업에 따라 다시 돌아오기에 현세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내일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하다는 것이다. 성서 시편에는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야고보서에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고 했다. 죽지 않은 생명은 없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죽어간다는 것이다.
파드마 삼바바의 사자의 서에 나오는 기도문에 ‘지금은 죽음의 순간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모든 집착과 갈망을 버리고/ 정신을 흩뜨리지 않고/ 가르침의 선명한 자각 안으로 들어가/ 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을 떠날 때/ 나는 그것이 덧없는 환상임을 알리라./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버리고/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은/ 나의 투영임을 알아차리며/ 그것이 바르도의 환영임을 알리라.’ 했다.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이 사생(死生)의 윤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고귀한 존재로 거듭날 것인지 비 오는 가을날 에 김동수의 ‘나이를 먹는다는 것’ 시 한편을 음미하며 글을 맺는다. ‘햇살에 스며드는 일이다/ 가을 날 물들어 가는/ 감나무 잎처럼/ 뜨겁고 어두웠던 마음들/ 널어 말리며/ 이제 온 힘 다해 살지 않기로 한다./ 싹이 돋고 잎이 자라/ 낙엽이 지는 사이/ 자박 자박 누군가 오고/ 또 누군가 가버린/ 이 이역의 순례에서/ 그대와 나의 발자국/ 하나로 포개보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천천히 햇살에/ 말리는 일이다./ 나를 꺼내 말리는 일이다.’(‘나이를 먹는다는 것’ 김동수)
어떻습니까? 이언 김동수 시인의 <예술과 죽음의 인문학>을 2회에 걸쳐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죽음의 실상이 어느 정도 손에 잡히시는가요? 나이 40이 지나면 죽음의 보따리를 챙기라 하셨습니다. 그렁저렁 살다가는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뉘우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쁘다 바빠! 어서 죽음의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 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