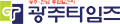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자살하는 놈’이란 표현을 입에 올리다니,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조선 최고의 책략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명회 관련 기록을 살펴보자.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 때의 일이다. 명나라 사신인 정동(鄭同)이 한강변에 있는 한명회의 정자, 압구정 구경을 원하자 한명회가 성종에게 용봉차일(龍鳳遮日, 용과 봉의 형상을 아로새겨 만든 장막. 임금의 행차 때 쓰는 것)치기를 청한다. 그러자 당시의 대간(임금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간하는 사람)들이 한명회의 무례함을 가리켜 ‘임금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다’하여 죄 주기를 강력하게 아뢴다. 결국 성종은 그들의 성화에 떠밀려 그저 죄 주는 시늉으로, 한명회의 직첩만 회수한다.
그러나 그도 잠시 성종은 한명회의 직첩을 회수한지 두 달도 안돼 다시 복직시킨다. 성종의 조처에 대해 사간들은 반발했다.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과 집의(執義, 조선시대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부 소속 종3품 직제) 이명숭(李命崇)이 경연이 파하자 성종에게 간곡하게 아뢴다. “두어달도 못가서 갑자기 복직시킨 것은 악한 자를 징계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성종이 한마다 한다. “악한 자를 징계함이 어찌 시일이 오래고 빠른 데에 달려 있겠는가?” 이어 신하들에게 의견 개진을 요구하자 영사(領事, 정1품 관직)인 심회(沈澮)가 대답한다.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직시켰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즉각 강자평이 나선다. “대신(大臣, 심회)이 재상(宰相, 한명회)의 일에 있어서 바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훗날 서로 얼굴보기 곤란할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명숭이 뒤를 잇는다. “주상께서 좌우에게 물은 것은 곧은 말을 듣고자 한 것인데, 심회의 대답은 곧지를 못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옛말에 ‘오래지 않아 되돌아 왔으니 후회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다시 결정함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에 대한 성종의 답변이다. “불경에 대한 죄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직첩만을 거둔 것이다.” 성종의 구차한 답변에 한명회를 벌주자는 대간들의 주장이 이어지지만 성종은 그를 묵살하고 한명회를 중용한다.
조선시대 대역죄중 대역죄인 왕을 사칭하고자 했던 한명회, 또 언로를 담당했던 대간들의 청을 무시하고 그에게 죄주기를 거부했던 성종의 행위를 살펴보면 흡사 현실의 한 장면을 목격하는 듯하다. 이른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싸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말이다.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당연히 인사조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을 보호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몸부림이 처절하다. 흡사 그 속사정도 한명회의 경우와 유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만약 당시 성종이 한명회를 내쳤다면 조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리란 사실은 명약관하다. 한명회의 세력들이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언에 의하면 우 수석의 세력도 결코 한명회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수석을 내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권력누수로 인한 국정파탄을 우려해서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렇게도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자리를 지키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