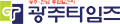노골적 사드 보복…여행금지령+불매운동까지
“다양한 채널 통해 통상 마찰 방지에 주력해야”
중국 경제가 6% 중반대 성장으로 내려앉은 데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 측 보복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실질적 경제에 있어 보다 나은 결과를 추구하겠다"며 "고용 안정과 인민의 삶 개선을 위해 꾸준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바오치(保七·7%대를 지킨다)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중국은 2015년 6.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6%대에 들어선 이후 2016년 6.7% 성장했다. 올해 목표대로 6.5% 성장률을 나타낸다면 3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셈이 된다.
중국 당국은 그 동안의 고도성장기를 지나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 경제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생산요소 투입 확대가 아닌 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및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당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다수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중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함에 따라 한국 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러나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의 저성장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 위축 등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그래도 중국 경제의 속도 조절이 우려스러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후 경제 보복은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배격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된 가운데 여행금지령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은 혐한(嫌韓)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열을 올리며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인 만큼 이러한 조치는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한국산 폴리옥시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광섬유 반덤핑 조치도 연장한 바 있다. 조미 김 세균 수 제한이나 조제분유 등록 제한 등의 조치도 있었다.
한동안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최근에서야 수출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중국의 통상 압력이 어느 정도로 거세질지가 중대한 관건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내놨던 각종 내수 정책도 빛이 바랄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온·오프라인 단체 여행 상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구두 지시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면세점을 늘리는 등 '큰 손'인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지시로 여행객의 절대적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면세점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시장 침체 등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경기가 냉각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불황에 빠지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회복이 전체 수출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이라며 "최근 한한령(限韓令)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 마찰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